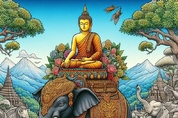-

총무원장 일정스님의 “곧은 마음이 부처입니다”
법왕청신문 이정하 기자 | 마음이 곧 부처라 하였습니다. 진리를 멀리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에 깊은 의미를 담고, 우리가 내쉬는 한숨 한숨마다 자비의 향기를 머금는다면, 그 자리가 곧 도량道場이요, 그 삶이 곧 수행修行이 됩니다. 사람은 본래 청정한 존재입니다. 번뇌도, 탐욕도, 미움도 덮여진 것이지, 태어난 마음은 맑고 고요합니다. 그러니 다른 데서 길을 찾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 안에 이미 그 길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자비로움으로 말하고, 지혜로 듣고, 감사함으로 걸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부처님의 법문이 됩니다.
- 이정하 기자
- 2025-08-26 07:55
-

법왕 담화총사의 “무심으로 비추는 달빛”
법왕청신문 이정하 기자 | 백 가지 지혜가 단 하나의 무심無心만 못하다는 말은 생각이 깊을수록 본질에서 멀어질 수 있음을 일깨운다. 안팎의 마음을 버리고, 지금까지 쌓아온 공덕조차 버려야만 비로소 부처의 길이 열린다는 말씀, 이는 곧 ‘놓는 것이 얻는 것이다’라는 도리다. 삼계三界는 불타는 집이다. 그 속에서 진정한 법왕은 누구인가? 석가도 미륵도 아닌, 당신의 눈동자 안에 비친 그 자성이 법왕이다. 그러니 외호外護의 이름에 메이지 말고 내면의 광명을 바라보아야 한다. 내가 설한 일체의 법은 모두가 ‘조병무早騈拇’라 하셨다. 즉, 필요 이상으로 덧붙인 말일 뿐, 진실을 가리는 안개일 수 있음을 경계하신 것이다. 오늘 일을 묻는가? 달은 강마다 고요히 비친다. 강이 맑으면 달빛은 더욱 또렷하고, 마음이 고요하면 진리는 스스로 드러난다. 효봉스님은 입적하는 그날에도 “화두가 들리십니까?”라는 물음에 세 번 ‘무無’라 하시며 삶과 죽음, 얻음과 놓음을 한 줄기 화두로 삼아 떠나셨다. 우리도 묻지 말고, 지혜를 꾸미지 말며, 그저 달빛을 받아들일 마음 그릇 하나를 비워둘 일이다.
- 이정하 기자
- 2025-08-19 06:44
-

총무원장 일정스님의 법성의 자리, 허망한 실체를 놓다
법왕청신문 이정하 기자 | 법성본무생法性本無生이란, 법의 본성은 애초에 생겨남도, 사라짐도 없는 자리입니다. 태어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자성自性입니다. 그러나 중생의 눈에는 세상 모든 것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변화로 보이기에, 거기에서 온갖 집착과 번뇌가 일어납니다. 시현이유생示現而有生이란, 부처님은 이러한 중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생겨남이 있는 듯 시현해 보이십니다. 진리는 말 없이도 머무나, 중생의 깨달음을 돕기 위해 부처는 모습과 소리를 빌려 진리를 설하시고, 그 진리를 일깨우기 위해 육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방편方便'입니다. 시중무능현 역무소현물 是中無能現 亦無所現物이라, 그렇다면 이 모든 시현 속에는 '나타내는 자'도, '나타나는 대상'도 없습니다. 이는 곧 ‘주체와 객체’, ‘너와 나’라는 이분법적 분별이 진실이 아님을 뜻합니다. 보는 이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는 경계, 그것이 바로 무생법인無生法忍의 세계입니다. 세간의 눈에는 분명히 '있다'고 보이지만, 진리의 눈으로 보면 거기엔 실체가 없습니다. 불생불멸, 무소무위한 그 자리를 본다는 것, 그것이 바로 법성法性을 보는 눈, 지혜의 눈입니다. 오
- 이정하 기자
- 2025-08-19 06:22
-

종정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 “돌솥 차 향기 천하에 퍼지리
법왕청신문 장규호 기자 |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가 오는 8월8일(윤 6월15일) 을사년 하안거(夏安居) 해제를 앞두고 법어를 내렸다. 성파 종정예하는 수행을 마친 안거 대중에게 “안거(安居)가 원만했고 자자(自恣)가 원만했으며 인연 있는 이들에게 전해줄 법식(法食)이 넉넉하니 금년 하안거는 제천이 환희하고 부처님께서 칭찬할 만하도다”며 “이 모두가 제방에서 수행하는 여러 선승들과 수행을 돕는 여러 소임자들과 신심 있는 불자들의 정성 어린 후원으로 이루어진 거룩한 불사이니 참으로 찬탄하노라”고 설했다. 이어 행을 점검하고, 산문을 나서는 수행자의 면면이 중생들에게 법(의심의 여지 없는 진리)이 되고 희망이 되기를 당부했다. 종정예하는 “폭우로 신음하는 여러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이 되고, 갈등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을 품어내고 풀어줄 넓은 가슴이 있는가?”라고 묻고 “그대들의 걸음걸음은 법이 되고 얼굴에 피어나는 미소는 희망이 되리라. 누군가가 영축산의 소식을 물으면 어찌 답하시려는가? 올여름 무더위에 구룡지 옆 백일홍은 더욱 붉게 피어나고 돌솥에 차 향기는 더욱 진하다네” 하였다. 한편, 전국선원수좌회에서 전국 선원의 정진대중 현황을 정리한 <을
- 장규호 기자
- 2025-08-04 11:47
-

법왕 曇華禪窓담화선창 "더위도 식히는 선창의 이야기"
법왕청신문 이정하 기자 | 水聲松影裏 禪意自淸閑 수성송영리 선의자청한 물소리가 흐르고 소나무 그림자 드리운 자리, 그곳에서 참선의 뜻은 저절로 맑고 고요하구나. 여름 바람이 뜨거워지는 아침, 차가운 물소리와 흔들리는 나뭇잎 사이로 잠잠히 앉아보세요. 더위를 피하려 하지 말고, 더위 속에 숨은 맑은 자리를 찾는 연습을 해봅시다. 덧없음을 아는 자는 서두르지 않는다. 덧없는 꽃은 피었다가 이내 지지만,그 향기는 사람의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합니다. 젊음은 지나가고, 소유는 흩어지고, 감정은 흔들리며, 몸도 마음도 언젠가 멈춥니다. 그 덧없음을 알면 집착이 줄고, 탐욕이 식고, 마음이 맑아집니다. 그 순간 우리는 참된 ‘보시’와 ‘감사’, 그리고 ‘수행’의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선禪은 더위를 식히는 바람이다 “더위를 없애려 하지 말고, 더위 속에서도 시원한 마음 하나 품어보라.” 이 말은 선창에서 전해 내려오는 가르침입니다. 무더위에 짜증이 올라올 때, 몸은 땀에 젖었지만 마음만은 고요한 물 위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것이 선禪의 힘입니다. 여름 한가운데서 마음을 식히는 법 1. 숨 고르기 등을 곧게 하고 편안히 앉으세요. 들이쉬는 숨을 따
- 이정하 기자
- 2025-08-04 08:1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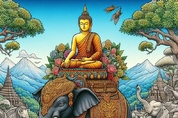
총무원장 일정스님의 “지혜로 위기를 벗어난 아가씨”
법왕청신문 이정하 기자 |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사람은 재산이 많은 늙은 부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한 홀아비였다. 이 홀아비에게는 총명하고 예쁜 딸이 하나 있었지만, 살림이 몹시 궁핍했다. 그래서 그는 자주 이웃의 부자 노인에게 돈을 꾸어 생활을 이어갔다. 처음엔 적은 돈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빚이 커져 갚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때 부자 노인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이젠 이 홀아비가 내 돈을 갚지 못할 테니, 그 딸을 대신 받는 게 좋겠군.” 는 입가에 음흉한 미소를 띠며, 바로 그 집으로 찾아갔다. 그날도 딸과 함께 앉아 근심에 잠겨 있던 홀아비는 노인의 방문을 받고 섬뜩한 예감을 느꼈다. ‘이 영감이 이제 와서 빚 독촉을 하려는구나…’ 그러나 손님을 차갑게 대할 수 없어, 겉으로는 반갑게 맞아들였다. 노인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점잔을 떨다가 슬쩍 말을 꺼냈다. 요즘 살림살이는 어떤가?”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끼니라도 잇도록 내가 돈을 좀 더 빌려주지…” 뜻밖에도 돈을 먼저 꺼내려는 태도에 아버지는 더욱 불안해졌다. 그러자 노인은 본심을 드러냈다. “이 나이에 혼자 살기가 외롭소. 그러니 그대 딸을 내 곁에 두고
- 이정하 기자
- 2025-08-04 07:46
-

총무원장 일정스님의 “대원본존大願本尊”
법왕청신문 이정하 기자 | “지옥이 텅 빌 때까지 나는 열반에 들지 않겠다.” 이 한마디 서원 앞에 우리는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먼저 오르고자 하는 이가 많고, 먼저 구원받고자 하는 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장보살은 가장 늦게 성불하겠다고, 가장 아픈 이들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중생이 모두 구제되기 전에는 혼자 편안해지지 않겠다는 대원大願을 세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지장대원본존地藏大願本尊이라 부릅니다. "대원"이란 무엇인가? 대원大願이란 큰 기도이며, 큰 책임이며, 큰 자비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엇을 이루고 싶다’는 소원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된 맹세입니다. 지장보살의 대원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가장 외로운 이, 가장 죄 많은 이, 가장 미움받는 이 곁에 머무는 실천입니다. "지옥의 문 앞에서 등을 돌리지 않는 자, 지옥의 불 속에서도 눈을 감지 않는 자 그가 바로 대원본존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서원을 세우며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 봅니다. “나는 어떤 원願을 품고 살고 있는가?” “나의 기도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세속의 이익이나
- 이정하 기자
- 2025-07-28 05:11
-

총무원장 일정스님의 “육도중생과 지장보살, 우리 가족이 함께 실천하는 자비의 마음”
법왕청신문 이정하 기자 | 가피암 일정스님의 생활 불교 이야기, 불교에서는 인간의 삶과 존재를 여섯 가지 세계로 구분합니다.이를 육도六道라 하며, 각각 지옥地獄, 아귀餓鬼, 축생畜生, 아수라阿修羅, 인간人間, 천상天上의 세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육도는 단지 내세의 길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는 감정과 상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지옥은 분노와 고통에 휩싸인 마음, 아귀는 끝없는 욕망과 허기, 축생은 어리석음과 본능에만 이끌리는 상태, 아수라는 질투와 다툼, 인간은 고통과 기쁨이 교차하는 현실로서 천상은 쾌락 속에 무상함을 잊고 살아가는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육도는 우리 가족 모두가 살아가는 감정의 지도이자 삶의 거울입니다. 지장보살, 가장 낮은 곳을 먼저 찾아가는 보살로서 불교의 위대한 보살 중 한 분인 지장보살地藏菩薩은 이 육도 중에서도 가장 고통이 극심한 지옥 중생을 먼저 구제하겠다는 큰 서원誓願을 세우신 분입니다. “지옥이 텅 빌 때까지 나는 열반에 들지 않겠다.” “모든 중생이 성불하기 전에는 나 홀로 성불하지 않겠다.” 이 원력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누구도 외면하지 않겠다는 책임의 자비, 고통의 한가운데로 기꺼이 내려가겠
- 이정하 기자
- 2025-07-25 07:31
-

총무원장 일정스님의 “산하무애山河無碍, 막힘 없는 길을 위하여”
법왕청신문 이정하 기자 | 예로부터 불가에서는 “산하무애山河無碍”라 하였습니다. 크게는 삼천대천세계가, 작게는 한 사람의 마음이 본래는 막힘이 없는 진리의 흐름, 무애無碍의 세계에 있다고 말입니다. 산은 산이고, 강은 강이지만 그 흐름에는 막힘이 없습니다. 물은 산을 돌아 흐르고, 산은 물을 품어 길을 내줍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는 작은 오해에도 막히고, 작은 차이에도 멈추며, 서로를 넘지 못할 벽으로 여깁니다. 세상은 소통이 막히고, 마음은 꽉 막혀 있다 요즘 세상은 온갖 정보와 소식이 넘쳐나고, 연결된 듯 보이지만 정작 마음은 서로를 향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정치의 벽, 이념의 벽, 세대의 벽, 그리고 감정의 벽, 그리하여 말은 많고 이해는 적으며, 속도는 빠르되 방향은 흐릿합니다. 어느새 우리는 ‘산과 강처럼 흐르는 삶’이 아니라 ‘벽과 장벽처럼 고립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무애란, 단순히 막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산하무애”의 참뜻은 모든 차별과 경계를 뛰어넘는 자비와 지혜의 실천에 있습니다. 무애란, 산이 물을 가로막지 않듯 내가 너를 가로막지 않는 것, 물이 바위를 돌아 흐르듯 고통과 시련을 돌아 나아가는 길입니다. 타인의
- 이정하 기자
- 2025-07-24 06:57
-

법왕 초대법왕 일붕 서경보 스님의 이야기『세계일화(世界一化)』 부록편
법왕청신문 이정하 기자 | 『세계일화』 부록은 초대법왕 일붕 서경보 스님의 유업을 이어받아 세계불교법왕청을 실천의 장으로 이끈 이들의 헌신을 담고 있습니다. 일붕 스님의 정신은 멈추지 않았으며, 그 뜻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작은 기록이 독자 여러분의 삶에도 평화와 자비의 씨앗으로 머물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발걸음은 전설이 되었고, 이어갈 걸음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세계일화』의 여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며, 자비의 물결은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을 적십니다. 감사합니다 제24장. 법왕청 설립의 취지 세계불교법왕청의 설립 취지 불법은 국경을 초월하고, 자비는 인류를 향해야 한다는 초대 법왕 일붕 서경보 큰스님의 가르침은 『세계일화』의 전편을 관통하는 등불과 같았습니다. 그 뜻을 계승하여 설립된 「(재)세계불교법왕청 평화재단」은 서울을 본부로, 세계 각국에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이 재단은 석가세존의 진리와 대자대비 사상을 바탕으로 인류의 평화, 불교 문화의 보존, 그리고 중생 제도라는 숭고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 공동체입니다. 이 조직은 단순한 종단의 틀을 넘어서, 유엔 정신을 실현하는 불교 교육 및 평화 실천 플랫폼으로서 기능하며,
- 이정하 기자
- 2025-07-24 04:55
-

법왕 초대법왕 일붕 서경보 스님의 이야기, 『세계일화』 제10편
법왕청신문 이정하 기자 | 글 / 담화총사 『세계일화』는 단지 한 고승의 생애를 기록한 전기가 아닙니다. 이 기록은 어둠 속에 길을 잃은 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을 밝혀주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 참된 평화의 길을 묻는 이들에게 자비와 지혜로 응답한 한 존재의 찬란한 발자취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초대 법왕 일붕 서경보一鵬 徐京保스님이 계십니다. 한 알 옥구슬처럼 맑은 전생의 인연으로 이 땅에 다시 태어나, 스님은 10대에 출가하여 구도와 학문, 실천과 포교, 그리고 자비와 화합의 불심으로 한평생을 불법佛法의 길에 바쳤습니다. 제1편부터 제9편까지, 우리는 그 여정을 따라 붕새처럼 세상을 향해 비상하는 스님의 삶을 보았습니다. 일제강점기의 고난 속에서도 진리를 구했던 청년기 불교학의 대강백들을 찾아 유학하고 삼장법사 학위를 받고 미국, 유럽, 아시아, 남미를 두루 다니며 불교의 위상을 드높이고 교황과도 교류하며 종교 간 평화의 길을 열었던 발걸음까지. 그 모든 여정은 진리와 자비는 국경이 없고, 참된 깨달음은 반드시 인류 전체의 평화를 향해야 한다는 스님의 신념의 발현이었습니다. 무려 153개국, 5,400여 단체로부터 '법왕'으로 추대받고, 세계 각국에서 7
- 이정하 기자
- 2025-07-23 03:32
-

법왕 초대법왕 일붕 서경보 스님의 이야기(9편)
법왕청신문 이정하 기자 | 글 / 담화총사 『세계일화』 제9편을 열며, 우리는 다시 한 번 초대법왕 일붕 서경보 큰스님의 숭고한 발자취를 되새기게 됩니다. 제21장 「꿈과 희망과 용기를」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전하고자 하신 스님의 깊은 사랑과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스님은 “하늘을 향한 아이들의 눈빛” 속에서 민족의 미래를 보셨고, 그들에게 정직과 노력, 큰 뜻을 가지라 당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제22장 「독창적인 선서화」에서는 선과 예술, 그리고 깨달음이 하나 되는 일붕체의 위대한 경지를 보여줍니다. ‘붓끝에 담긴 선의 우주’는 단지 글씨가 아니라, 진리의 숨결이자 자비의 향기입니다. 이 두 장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꿈을 간직하라, 자기 수양을 멈추지 말라, 평화를 향해 걸어가라는 법왕의 메시지로 남습니다. 진리의 등불은 오늘도 우리 가슴에 타오릅니다. 『세계일화』는 그 빛나는 걸음을 다시 따라갑니다. 진리의 등불은 멈추지 않고, 자비의 바람은 끊임없이 흐릅니다. 이제, 『세계일화』 제9편의 문이 열립니다. 제21장. 꿈과 희망과 용기를 청소년에게 전하는 법왕의 유산 세계를 향한 법왕의 길은 단지 수행자의 여정이 아니라,
- 이정하 기자
- 2025-07-22 07:29
-

총무원장 일정스님의 “나는 너로 인해 존재하고, 너는 나로 인해 존재한다.”
법왕청신문 이정하 기자 |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는 짧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됩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차유고피유,차무고피무此有故彼有, 此無故彼無 이것이 바로 연기緣起의 가르침이며,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진리가 바로 “상호연기相互緣起”입니다. 연기는 인연의 그물이다, 세상 모든 존재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한 송이 꽃조차도 그 꽃 하나만으로 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햇빛과 바람, 흙과 비, 벌과 나비, 농부의 손길과 시간의 인내, 모든 것이 어우러져야 비로소 한 송이 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라는 것이 독립적 존재라고 착각하지만, 내가 숨 쉬는 공기, 마시는 물, 심지어 생각하는 언어조차도 수많은 인연의 산물입니다. 이처럼 모든 존재는 서로를 조건 짓고, 서로를 떠받들며 살아갑니다. 상호연기란, 함께 살아가는 존재의 방식이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니, 그저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지만 이것은 연기의 눈으로 보면 무지의 말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뱉는 말 한 마디,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삶에 파문이 됩니다.
- 이정하 기자
- 2025-07-21 07:44
-

법왕 초대법왕 일붕 서경보 스님의 이야기, (제8편)
법왕청신문 이정하 기자 | 글 / 담화총사, 『세계일화』 제8편은 초대법왕 일붕 서경보 스님이 불교의 본산지인 스리랑카와의 인연을 통해 세계불교의 중심축을 새로이 정립하고, 동시에 그 업적이 기네스북이라는 인류 기록의 무대 위에까지 확장되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불교 전통이 깊은 나라로, 스님은 그곳을 세계불교법왕청의 총본산으로 삼아, 불교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전환점을 마련하셨습니다. 특히 스리랑카 건국신화에 담긴 인간과 짐승, 자비와 운명의 이야기를 통해, 자비와 진리의 세계사적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이어지는 제20장에서는 서경보 법왕의 생애가 단지 한 종교 지도자의 행보에 머무르지 않고, 인류사에 길이 남을 세계 최고 기록들로 승화되는 과정을 조명합니다. 다수의 박사학위, 수백 권의 저서, 수십만 장의 선필 보시와 수백 개의 통일기원시비는 숫자를 넘어선 서원과 신심의 기록입니다. 제8편은 바로 이 두 흐름을 통해, 불교의 깊이를 인류의 언어로 확장시키고, 진리와 자비를 외교와 기록이라는 두 길로 전한 위대한 법왕의 발걸음을 다시 한 번 새기고자 합니다. .『세계일화』는 이제 다시, 그 찬란한 여정을 따라 걷습니다. 진리의 등불은
- 이정하 기자
- 2025-07-21 06:39
-

총무원장 일정스님의 “초월超越의 자리에서 피어나는 자비”
법왕청신문 이정하 기자 | 대중이여, 햇살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이마 위에나 고르게 내리며, 바람 또한 교회의 첨탑 위나 절의 지붕 위를 가리지 않고 쉼 없이 붑니다. 이것이 곧 법法의 평등성이요, 무차별 대자대비無差別 大慈大悲의 진리입니다. 고운 손 하나, 따뜻한 눈빛 하나에도 무량한 공덕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이름을 묻지 않고, 그 행위는 신분도, 종교도, 언어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하느님이라 부르고, 또 어떤 이는 부처님이라 부르며, 어떤 이는 아무 이름도 부르지 않지만, 굶주린 아이의 손을 잡는 순간, 우리는 모두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름의 자리가 아니라 자비의 자리이며, 기도의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울림입니다. 참된 나눔 앞에서는 종교도 국경도 언어도 조용히 물러납니다. 남는 것은 오직 한 사람, 사람의 자리입니다. 손을 내민 이는 신의 뜻을 전한 것이며, 그 손을 받아 든 이는 세상의 사랑을 품은 것입니다. 이것이 곧 보살행菩薩行이요, 자비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무릎 꿇을 수 있다면, 그것은 굴복이나 경배가 아니라, 깊은 이해와 존중의 다른 이름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하여 울 수 있다면,
- 이정하 기자
- 2025-07-20 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