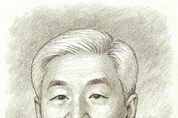법왕
섹션이슈
-

일붕 서경보 큰스님의 원력, 전국에 울려 퍼진 평화의 시심詩心
법왕청신문 이정하 기자 | 전국 곳곳에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시비(詩碑)가 세워졌다. 그 숫자만 해도 무려 788기. 이 뜻깊은 평화의 유산은 세계불교 초대법왕이자 한국 불교계의 큰 어른이신 일붕 서경보 큰스님의 원력에서 비롯되었다. “남북이 하나 되어, 세계 평화로 나아가는 길목마다 평화의 언어가 있어야 한다”는 깊은 신념 아래, 큰스님은 수십 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에 세계평화·남북통일기원시비를 세우는 대원력의 회향을 실천해오셨다. 특히 787번째 시비는 큰스님께서 열반하신 1996년 6월 25일, 분단의 상징인 임진각 통일촌 마을에 건립되어 더욱 깊은 의미를 간직한다. 통일을 향한 큰스님의 평생 염원이 깃든 그 자리에서, 시비는 오늘도 조용히 사람들의 마음에 말을 건넨다. “통일이여, 오라. 평화여, 피어나라.” 이 시비에는 단순한 시구만이 새겨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반도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전하려는 거룩한 정신의 표상이다. 총 788기에 이르는 시비는 그 자체로 평화의 등불이며, 시심(詩心)으로 새겨진 민족의 기도문이다. 통일을 바라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염원을 담아낸 상징이자, 한국 불교가 세계를 향해 펼친 자비와 지
- 이정하 기자
- 2025-05-26 14:44
-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전국 사찰서 일제히 봉행
법왕청신문 이정하 기자 |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5월 5일 오전 10시,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주요 사찰에서 봉축법요식이 일제히 봉행됐다. 조계사에서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지도자와 정·관계 인사, 불자 등 1만여 명이 모여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을 찬탄하고 자비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조계사에서는 도량결계, 육법공양, 관불의식, 마정수기 등 전통의식과 함께,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 평화와 자비 실천을 다짐하는 발원문이 낭독되었다. 법요식은 명고·명종, 반야심경 봉독, 봉축사, 헌등·헌화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부처님의 탄생은 단지 한 생명의 출현이 아닌, 모든 존재가 지닌 존엄성과 자각의 가능성을 선언한 사건”이라며 “내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곧 세상을 밝히는 첫걸음”임을 강조했다. 이어 “삼독심(탐·진·치)을 비우고 자비와 복덕의 보살심으로 맑은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설파했다. 진우스님은 어린이날을 맞아 “오늘의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분열과 불안이 아닌 자비와 평화로 가득하길 기도한다”며 정치권에도 “맑은 정치, 따뜻한 행정”을 당부했다. 성파 종
- 이정하 기자
- 2025-05-06 07:29
-

담화총사의 "일붕기념관 헌정문"
법왕청신문 이정하 기자 | 오늘, 부처님오신날의 거룩한 뜻을 기리며, 세계불교 초대법왕이신 일붕 서경보 존자 예하의 위대한 가르침과 숭고한 뜻을 영원히 계승하고자 "일붕기념관 헌정문"을 삼가 바칩니다. 담화총사는 일붕 존자 예하를 8년 6개월 동안 가까이 모시며, 수행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의 소임을 다해왔습니다. 이 인연을 바탕으로, 존자 예하의 성스러운 자취를 길이 보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하여, 벽사초불정사 3만 5천여 평의 부지 위에 약 200평 규모의 '일붕 존자 기념관' 건립을 발원하고, 이에 설계 작업에 착수하였음을 삼가 아룁니다. 이 기념관이 불법佛法의 등불이 되어 후세에 길이 빛나기를 발원합니다. 푸른 바람 속에서 태어나, 세상의 모든 고통을 품고자 하셨던 이여. 1914년 제주 서귀포 땅에 빛으로 내려오신 초대법왕 일붕 서경보 존자 예하, 그 발자취는 곧 불법(佛法)의 길이었고, 그 숨결은 세계 평화와 인류 공존의 노래였나이다. 불국사의 종소리로 진리의 씨앗을 심으셨고, 미국과 세계 오십 개국을 순회하며 불법의 등불을 밝히셨으며, 153개국 5,300여 불교단체의 추대로 세계불교법왕청을 창설하고, 첫 번째 세계불교 법왕初代法王의 위대한 위상을 세
- 이정하 기자
- 2025-04-29 11:49
-

담화총사의 “벽사초불정사에 부치는 노래”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담화총사가 “벽사초불정사에 세계불교 초대법왕이신 일붕 서경보 존자 예하의 뜻을 받들어 불사에 부치는 노래”를 헌정 하였다. 다음은 담화총사의 “벽사초불정사에 부치는 노래” 전문이다. 십만 불빛이 모여 어둠을 깨뜨린다, 벽사초불정사여, 고요 속에 피어나는 별빛이어라. 푸른 바람을 가르고 큰 새 一鵬은 날아올랐다. 세상의 끝, 하늘의 끝, 법法의 빛을 싣고 세계를 품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바다를 건너 산을 넘어 불법의 씨앗을 뿌리며 평화의 바람을 일으켰다. 이제, 그 발길은 멈추지 않고 청주의 별 아래, 벽사초불정사에 내려앉아 우주의 달빛과 숨을 나눈다. 삿된 기운을 물리치고 복의 노래를 부르며, 진리의 등불로 다시금 어둠을 밝히리라. 고요 속에 빛나라, 벽사초불정사여. 영원 속에 피어나라, 一鵬의 뜻이여. 담화총사曇華總師 두손모음...
- 이준석 기자
- 2025-04-28 15:52
-

평화의 날 제정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1994년,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열린 제2회 세계불교법왕청 총회에서 부처님오신날을 ‘세계불교평화의 날’로 제정한 사건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선, 불교가 세계 평화의 중심 철학이 될 수 있음을 알린 역사적 전환점이었다. 당시 한국의 일붕 서경보 스님과 스리랑카의 찬다난다 스님이 공동 법왕으로서 함께 선포한 이 결정은, 불교권 국가 간 연대의 첫 결실이자 동서 불교의 조화로운 통합의 상징이기도 했다. ‘우주는 하나, 세계는 한 가족’이라는 법어 속에는 종교의 경계를 넘어 모든 생명의 공존과 평화를 향한 불교의 다짐이 담겨 있었다. 이제 우리는 묻는다. 그 선언은 일회성 행사로 끝났는가? 아니다. 그날의 외침은 오늘도 되살아나고 있다.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분열, 갈등으로 신음하고 있다. 핵무기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고, 종교 간 충돌과 환경 파괴는 새로운 위기로 다가온다. 이럴 때일수록, 30여 년 전 선포된 ‘세계불교평화의 날’의 가치는 더욱 절실하다. 평화는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계속 이어져야 한다. 실천과 전승으로 삶 속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불교는 침묵 속의 외침이다. 수행은 조용하지만 그 목적은 크다. 세상에 평화를, 마음
- 김학영 기자
- 2025-04-23 09:14
-

불기2569(2025)년 부처님오신날 법왕청 이사장 봉축 법어입니다.
법왕청신문 이정하 기자 | 불기2569(2025)년 부처님오신날 법왕청 이사장 봉축 법어입니다. 一切衆生 悉有佛性 일체중생 실유불성 모든 중생은 부처님의 성품을 지녔습니다. 應當自覺 勿尋外境 응당자각 물심외경 진리는 스스로 깨닫는 것이며,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一燈能破 千年之暗 일등능파 천년지암 등불 하나가 천 년의 어둠을 밝힙니다. 微慈化苦 愍念群生 미자화고 민념군생 작은 자비가 고통을 녹이고, 모든 중생을 어루만집니다. 怨親平等 同體大悲 원친평등 동체대비 원수와 벗을 평등히 여기며, 하나 된 자비로 품어야 합니다. 今此佳辰 如來降誕 금차가신 여래강탄 오늘은 여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룩한 날입니다. 發心照世 慈光普照 발심조세 자광보조 우리의 발심이 세상을 비추고, 자비의 광명이 두루 퍼지기를. 願以此燈 功德無量 원이차등 공덕무량 이 등불의 공덕이 무량하게 펼쳐지기를 발원합니다. 願世和平 汝心慈悲 원세화평 여심자비 세상에는 평화가, 그대 마음에는 자비가 머물기를... 불기 2569년 사월초파일 (財)法王廳 平和財團 (재)법왕청 평화재단 理事長 曇華總師 合掌 이사장 담화총사 합장
- 이정하 기자
- 2025-04-22 21:3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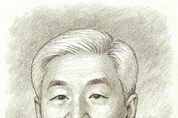
담화풍월曇華風月 "벽사초불정사"
법왕청신문 이정하 기자 | “벽사초불, 그 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벼락처럼 다가오는 삶의 번뇌와 고통, 어둠 속을 헤매는 중생의 마음을 위하여 이곳에 우리는 ‘벽사’라 말하노니,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고, 어지러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함이요. 또한 ‘초불’이라 부르노니,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이끌어 맑은 빛으로 길을 밝히고, 희망과 평안을 되찾게 하기 위함이라. 이 도량은 벗어남과 맞이함이 공존하는 곳이니, 불행은 떠나가고 복된 인연은 다가오는 진정한 귀의처歸依處요, 위안의 터전이 되리라. 이 문을 들어서는 순간, 당신의 삶 또한 새로운 걸음을 내딛게 되리라. 벽사라 말하고, 초불이라 부르라. 그리하여 이 정사精舎는 세상의 모든 고통을 걷어내고 불佛의 길을 밝히는 곳이 되리라. 벽사초불 정사 낭독문 한 구절씩 천천히, 목탁에 맞춰 낭독하거나 걸음에 맞춰 조용하게 따라해 보세요. 벽사라 말하니, 나쁜 기운 물러가고 초불이라 부르니, 부처님의 빛이 오네 벽사라 말하니, 번뇌와 괴로움 사라지고 초불이라 부르니, 지혜와 자비가 피어나네 이 문을 들어서면, 나도 새로워지고 이 마음 비우면, 복이 다가오네 말하라, 벽사라 부르라, 초불이라 어둠을 걷고 빛으로 가는 길
- 이정하 기자
- 2025-04-03 07:55
-

담화풍월曇華風月 “선禪의 용광로鎔鑛爐” 마음을 녹이다.
법왕청신문 이정하 기자 | 우리가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매 순간을 선택하고, 그 선택의 결과로 기쁨과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갈등과 번뇌를 마주합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 내 안의 기대, 과거의 상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그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을 달구고, 때로는 부서지게 합니다. 그러나 수행자는, 그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괴로움을 억누르지도,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그 불길 속에 스스로 들어갑니다. 그대가 느끼는 분노와 슬픔, 억울함과 두려움, 집착과 후회, 그 모든 감정을 선禪의 용광로鎔鑛爐에 넣으십시오. 쇳덩이가 불 속에서 본래의 빛을 드러내듯, 마음의 고통 또한 그 불길을 통해 녹고 다듬어져 마침내 자비와 지혜가 됩니다. 선이란 멀리 있는 특별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선은 지금, 여기, 이 순간에 깨어 있음입니다. 선은 바라보는 힘이며, 선은 마주 앉는 용기입니다. 선은 나를 들여다보는 거울이며, 타인을 품는 빈 그릇입니다. 참선은 그 불입니다. 관조는 그 바람입니다. 깨달음은 그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입니다. 선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껴안아 그것을 통찰로 바꾸는
- 이정하 기자
- 2025-04-01 09:19
-

담화풍월曇華風月 “無相을 觀하라!” 형상이 없는 것을 보라!
법왕청신문 이정하 기자 | 사람들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모양이 있는 것, 색이 있는 것, 이름이 붙은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요.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거꾸로 말합니다. “無相을 觀하라.” 형상이 없는 것을 보라 하십니다. 왜일까요? 형상은 덧없고, 마음은 움직이며, 세상은 늘 변하기 때문입니다. 무상을 관한다는 것은, 형상 너머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기르는 일입니다. 꽃은 피고 지고, 물은 흐르고 말라가며, 사람의 마음도 매 순간 바뀝니다. 이 모든 것이 상(相)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텅 비어 있으면서도 충만한 '진실한 자리', 그것이 바로 무상이요, 공空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겉모습에 머무르지 않고, 좋고 싫음에 얽매이지 않으며, 있다, 없다를 넘어선 참된 자리를 보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무상을 본다는 것은, 곧 집착에서 벗어나는 일이며, 해탈로 가는 길입니다. 형상이 없기에, 물들지 않으며, 사라지지도 않으며,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생각을 놓고, 무상無相을 관해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을 볼 수 있을 때, 진짜 나도, 진짜 세상도 보이기 시작할 것
- 이정하 기자
- 2025-03-31 08:34
-

붕새가 날은 까닭은 “털 달린 귀신의 방귀”
법왕청신문 이존영 기자 | 일붕의 도미로 활기를 띤 세계선 센터 건축은 미국불교단(ABO)과 재미 한국불교회가 샌프란시스코 미국불교단 본부에서 설립위원회를 조직함으로써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미 설립된 일본 조동종 선 센터를 능가하는 건물을 짓기로 합의했다. 당시 미국 포교 80년이 된 일본 불교도 시즌에 의한 22만 평의 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때문에 일붕을 따르던 제자들은 한국 불교의 전진 기지가 될 세계선 센터가 세계불교도대회를 치를 만한 수준이 되어야 일본 불교를 능가할 수 있다고 믿었다. 후원자들은 심사숙고한 결과 한국의 전통적인 사찰인 <불국사>를 모델로 하여 전문적인 선 센터는 석조 돔형으로 짓고, 일반 신도가 사용할 도량은 양옥으로 지어 동서양의 건축을 조화시키기로 했다. 이러한 결정이 알려지자 인근의 목재업자는 한국 고대 건축씩 사원을 짓는데 소요되는 목재를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필라델피아 불교신도회 회원인 러셀 씨는 일붕의 저서 <오색주>와 <한국 불교사화>를 극으로 각색하여 뉴욕의 시내 극장에서 공연하고, 그 수입금을 후원 회비로 내놓겠다고 했다. 또 어떤 신도는 일붕의 포교 활동을 담은
- 이존영 기자
- 2025-01-31 14:58